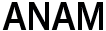|
|
황유원 옮김/문학동네/모비딕1 514쪽, 모비딕2 538쪽/2019년 출판 허멘 멜빌의 소설 ‘모비 딕’은 1851년에 출간되었다. 멜빌이 살아있을 당시에 이 소설에 대한 반응은 그리 좋지 않았다. 하지만 1920년대에 이른바 멜빌 부흥을 거쳐 현재는 19세기 미국문학의 걸작이자 세계문학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나는 황유원씨가 번역한 문학동네 판본으로 이 작품을 읽어보았는데 두 권에 걸쳐 1000여 쪽에 이른다. 모비 딕을 읽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이것은 고래에 대한 소설인가, 소설을 빙자한 고래 백과사전인가?” 재미만 있다면 1000쪽도 읽기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고래학, 고래잡이학이라고 일컬어질만큼 고래와 고래잡이에 대해 백과사전적인 사실적인 정보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도 상상이 안 갈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소설을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으니까 말이다. 게다가 그 사실적인 정보들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어려운 해양 용어들로 이루어져 있다. 포경선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계속해서 나오는데 도대체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는다. 나는 보통 외국작품을 읽으면서 번역가에 대해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 소설을 읽는 내내 번역가에게 감탄을 하면서 그리고 그가 얼마나 번역을 하느라 힘들었을지 생각하면서 읽었다. 아니나 다를까 소설 뒤에 해설부분을 보니 번역가가 말하길 번역하기가 정말 힘들었다고 한다. 이 작품을 다시 번역하라고 한다면 차라리 몇 년간 원양어선을 타는 편을 선택하겠다고 한다. 그 정도로 이 작품은 번역하는 것도 읽는 것도 쉽지 않은 작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은 굉장히 깊이가 있고 풍요로운 알레고리들로 가득차 있어서 읽어볼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야기의 기본 줄거리 자체는 간단하다. 이슈미얼은 추장의 아들 퀴퀘그와 함께 고래잡이배 피쿼드호에 승선한다. 피쿼드호의 선장 에이해브는 모비 딕이라는 흰 향유고래에게 한 쪽 다리를 잃은뒤 복수심에 사로잡혀 모비 딕을 쫓는다. 모비 딕은 수많은 고래잡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악명 높은 고래이지만 복수심에 눈이 멀어 분별력을 잃은 에이해브 선장은 모비 딕을 광적으로 쫓는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1등 항해사 스타벅이 여러차례 에이해브 선장을 말리지만 에이해브 선장은 스타벅의 만류를 뿌리치고 무리하게 모비 딕을 공격하다가 결국 모비딕에게 공격을 받아 자신은 물론 배에 탄 선원 전부다 물에 빠져 죽게 만든다. 그 중 이슈미얼만 겨우 살아남아 이 이야기를 전해준다. 고래잡이가 번성하던 19세기에는 고래 기름으로 불을 밝히거나 난방을 했다. 향유고래의 머리에 든 기름으로 만든 양초는 인기가 아주 좋았다. 특히 고래의 몸 속에서 채취한 용연향은 향수의 원료로 비싼 값에 거래되었다. 그래서 고래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해가 가면서도 고래가 불쌍한 생각이 많이 들었다. 고래를 찌르고 자르고 파내고 피가 낭자하고.. 이런 묘사를 볼 때 마음이 아팠다.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인간으로 말미암아 자연만물이 신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이 떠오른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두 번째로 든 생각은 ‘노동의 신성함’에 대한 것이다. 포경선에서는 고래를 잡기 위해 역할이 분담되어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일을 한다. 직접적으로 고래를 잡는 사람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고래잡이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있다. 도구가 고장났을 때 수리를 하거나 물건을 만드는 목수나 대장장이도 있고, 음식을 책임지는 요리사도 있다. 고래를 잡는 것이 목표이지만 그 목표는 한 사람의 힘과 용기로 이루어낼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돛대 꼭대기에서 망을 보는 사람, 작살을 던지는 사람, 밧줄을 끌어당기는 사람, 노를 젓는 사람, 고래 손질을 하는 사람, 기름을 짜내는 사람 등등 말이다. 여러 사람의 분업, 협업이 인상적이었고 또한 힘겹게 노동을 하는 모습들을 보며 숙연한 생각이 들었다. 작품 속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을 옮겨 적어본다. 밤에도 쉬지 않고 아흔여섯 시간 동안 내리 계속되는 가혹한 노동이 끝났을 때, 하루종일 적도에서 노를 젓느라 손목이 다 부은 상태로 보트에서 내려 갑판에 오르자마자 거대한 쇠사슬을 옮기고, 무거운 권양기를 감아올리고, 고래를 자르고 베고, 게다가 땀에 흥건히 젖은 상태로 적도의 태양과 적도의 정유 작업장이 힘을 합쳐 뿜어내는 불길에 또다시 훈제되고 그을렸을 때, 이 모든 일을 끝내기가 무섭게 간신히 힘을 내서 배를 깨끗이 세척해 마침내 그곳을 티 하나 없는 낙농장의 착유장으로 만들어놓았을 때, 그리고 이 가련한 친구들이 깨끗한 작업복의 단추를 이제 막 목까지 채워넣었을 때, 별안간 “저기 고래가 물을 뿜는다!” 하고 들려오는 외침에 깜짝 놀라서 다시 또다른 고래와 싸우러 쏜살같이 달려갔다가 그 피곤한 작업을 전부 되풀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오오! 친구들이여, 이것이 사람 잡는 일이 아니면 또 무엇이겠는가! 하지만 이런 게 인생이다. 우리 인간들은 오랜 노역을 통해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고래 몸뚱이에서 적지만 귀한 경뇌유를 뽑아낸 후, 피곤한 와중에도 인내심을 발휘해 더러운 몸을 씻어내고 영혼의 임시 거처인 이 깨끗한 육신에서 살아가는 법을 깨닫자마자, 별안간 들려오는 ‘고래가 물을 뿜는다’라는 소리에 그만 넋을 잃은 채 또다른 세계와 싸움을 벌이러 출항해야 하고, 젊은 시절과 똑같은 일상을 다시 반복해야 하는 존재인 것이다. (2권 p.258-259) 쉬지 않고 96시간(4일) 동안 혹독한 노동에 시달린 뒤 이제 좀 쉬려고 했는데 또 다시 고래가 발견되어 그 힘든 노동을 다시 시작해야했을 때의 기분이란 어떨까? 고래를 잡는게 아니라 사람을 잡을일이란다. 그런데 이런게 인생이란다. 공감이 많이 가는 대목이다. 에이해브가 주인공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에이해브에게 그다지 관심이 가지는 않았다. 솔직히 그의 캐릭터는 진부하게 느껴졌다. 복수심에 불타는 광기어린 독선적인 인간이라는 캐릭터는 솔직히 진부하지 않나? 그리고 결과는 안 봐도 뻔하지 않나. 그래서 에이해브의 캐릭터나 그로 말미암아 파멸에 이르는 서사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보다는 중심 소재가 고래이고 배경이 바다인 것이 예술적으로 느껴졌다. 우리가 마주하는 이 대상들이 얼마나 거대한가? 고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동물이고, 바다는 인간이 정복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깊이와 너비가 얼마나 광대한가 말이다. 바다라는 무대에서 고래와 싸우는 작은 인간들이란 존재는 어떻게 보면 무모하고 어떻게 보면 용감하게 느껴진다. 작품 속에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웅장한 책을 쓰려면 반드시 웅장한 주제를 택해야 한다. 벼룩에 대한 책을 쓰려고 시도해본 이들은 많겠으나, 그 주제로는 결코 불후의 명작을 쓸 수 없다.”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다. 벼룩을 주제로 웅대한 작품, 불후의 작품을 쓸 수 있을까? 그럴수는 없다. 그것은 고래라야 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 작품의 미덕은 ‘거대함’이다. 또 한 편으로 그 거대함 속에 ‘세밀함’이 녹아있다. 고래라는 거대한 생물체를 다루면서 그것의 몸통뿐만 아니라 세포까지도 다룬다. 또한 끝없이 펼쳐지는 망망대해를 묘사하면서도 망망대해에서 떠다니는 배 한 척을 돋보기로 들여다보듯이 묘사한다. 거대함과 세밀함이라는 극과 극이 부자연스러운듯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예술적미를 한껏 느끼게 해 주는 작품이 바로 ‘모비 딕’이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이 내가 힘겹게 모비딕을 읽고 얻은 용연향이다. |




| 

|